- ○ 그니 리뷰

나는 누가 살다 간 여름일까
- 글쓴이
- 권대웅 저
문학동네

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여름의 눈사람들.
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것들.
가을밤 하늘에 보이지 않는 소 한 마리가
달을 끌고 간다.
- 시인의 말 中 -
[ 저녁이 젖은 눈망울 같다는 생각이 들 때 ]
눈은 앞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뒤를 볼 수도 있다
침묵이 아직 오지 않은 말을 더 빛내듯
보지 않은 풍경을 살려낼 때가 있다
 눈을 감았을 때
눈을 감았을 때
바보의 무구한 눈망울을 보았을 때
마음의 뒤란에 가꾸고 있는 것이 많을 때
뒤를 만지듯
얕은 것보다 깊은 것들을 살려내는 눈
황소의 젖은 눈처럼 저녁이 온다
꿈벅거리는 큰 눈 속으로 땅거미가 진다
땅속이 환해서 뿌리가 자란다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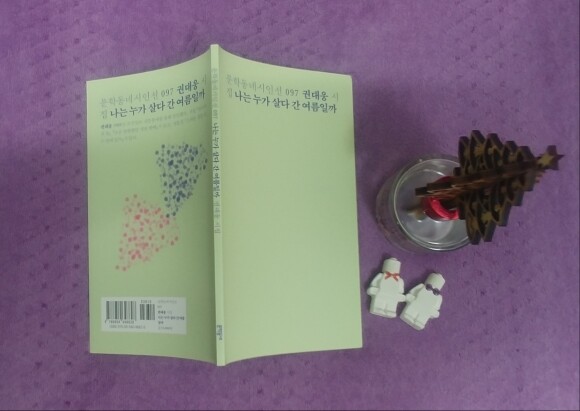
[ 땅거미가 질 무렵 ]
어둑어둑해지는 저녁 길을 걷다보면
풍경 속에 또 다른 풍경이 들어 있는 것 같다
어디선가 본 것 같은
언젠가 만난 것만 같은
어스름녘
젖은 하늘의 눈망울
물끄러미 등 뒤에 서서
기억나지 않는 어젯밤의 꿈과

까마득하게 잊었던 시간들
생각날 듯 달아나버리는 생의 비밀들이
그림자에 어른거리다 사라진다
잡히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
만져지지 않으며 살고 있는 것들이
불쑥불쑥 잘못 튀어나왔다가
제자리로 되돌아가는 시간
그 밝음과 어둠이 섞이는 삼투압 때문에
뼈가 쑤시는
땅거미가 질 무렵
[ 당신이 다시 오시는 밤 ]
누가 환생을 하는가보다
봄밤 달에서 떨어지는 꽃향기가
 제삿날 피우는 향처럼 가득하다
제삿날 피우는 향처럼 가득하다
목이 멘다
내가 알았던 생이었나보다
기우뚱 떠오르려다
사라지는 나뭇가지 위
달이 밀어내는 꽃봉오리가 뜨겁다
이 밤에 당신 무엇으로 오시는가
목이 꺾이도록 달을 바라보다가
저 달 속에 그만 풍덩 몸을 던져
당신이 오고 있는 길
그 생 쫓아 다시 오고 싶다
 [ 설국(雪國) ]
[ 설국(雪國) ]
눈이 내린다
누군가 지상에 살며 저녁마다 켰던
등불이 내린다
어느 목련꽃 속을 지나왔을까
환하다
그 고요한 흰 미소 너머
있으면서도 없고
없으면서도 있는
설국
지붕마다 열 뼘 두께 눈이 쌓이고
며칠째 발이 묶인 주점 등불 아래
누군가 술을 마신다
맑은 술잔에 담긴 설원(雪原)속으로

기차가 달린다
멀어져가는 불빛 한 점
그리움으로 이어지는 밤의 긴 머리카락
하얗게 사랑해 하얗게
적멸이 되어 돌아오는 말과
꽃봉오리 속에 같혀 지샌
눈의 날들
너무 환해 기억이 나지 않아
밤에도 하얬다
[ 허공 속 풍경 ]
 처마밑으로 제비들이 분주히 드나들던 집
처마밑으로 제비들이 분주히 드나들던 집
허리둘레가 넓은 어머니처럼 든든해 보이던
장독 항아리들과 병정 같은 펌프가
우뚝 서 있던 마당
툇마루에 모이던 햇빛이 담장을 넘어
지붕 위로 올라갈 때마다 할머니는 아깝다며
소쿠리에 말릴 나물들을 더 얹었다
햇빛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
남은 생이 아까웠던 할머니
온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며
반지르르 닦아놓은 경대 위로
세월이 비껴가는 줄만 알았다
돌아보면 햇빛이 거두어가버린 집
어른거리는 골목 너머 장독대 너머
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어느 허공을 살다 간 것일까
할아버지는 아버지는 어느 허공을 살다 간 것일까
제비들이 처마밑으로 몰고 오던
씨줄의 공간 날줄의 시간들이
잡히지 않는 풍경으로 남아 있는
저 허공 속
환영(幻影)이야
[ 삶을 문득이라 불렀다 ]
지나간 그 겨울을 우두커니라고 불렀다
견뎠던 모든 것을 멍하니라고 불렀다
희끗희끗 눈 발이 어린 망아지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
미움에도 연민이 있는 것일까
떠나가는 길 저쪽을 물끄러미라고 불렀다

사랑도 너무 추우면
아무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
표백된 빨래처럼 하얗게 눈이 부시고
펄렁거리고 기우뚱거릴 뿐
비틀거리며 내려오는 봄 햇빛 한줌
나무에 피어나는 꽃을 문득이라 불렀다
그 곁을 지나가는 바람을 정처 없이라 불렀다
떠나가고 돌아오며 존재하는 것들을
홀연 흰 목련이 피고
화들짝 개나리들이 핀다
이 세상이 너무 오래되었나보다
당신이 기억나려다가 사라진다
언덕에서 중얼거리며 아지랑이가 걸어나온다
땅속에 잠든 그 누군가 읽는 사연인가
... 소/라/향/기 ...
- 좋아요
- 6
- 댓글
- 2
- 작성일
- 2023.04.26







